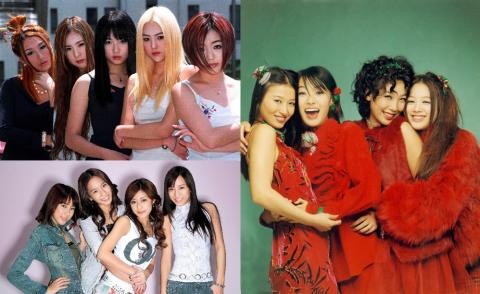잘 나갔던 ‘女 아이돌그룹’ 지금은 뭐할까?
원더걸스, 소녀시대, 2NE1, 카라…. 바야흐로 걸 그룹 전성시대다. SES와 핑클부터 샤크라, 클레오, 슈가, 쥬얼리까지 2000년 전후에도 지금처럼 여자 아이돌 그룹이 홍수를 이뤘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걸 그룹의 언니뻘 되는 일명 ‘언니돌’ 출신 멤버들은 현재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온 멤버가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핑클과 SES를 제외하고 추억이 됐지만 지금만큼이나 뜨거웠던 당시 ‘언니돌’ 멤버들의 근황을 알아봤다.
◆ 베이비 복스…CF 퀸 윤은혜 단연 으뜸
1997년 데뷔한 베이비 복스 멤버 출신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 단연 막내 윤은혜다. 출연 드라마인 ‘궁’에 이어 ‘커피 프린스’까지 홈런을 날린 윤은혜는 명실 공히 CF퀸으로 성장해 언니 멤버들 보다 더 큰 스타로 자리매김 했다.
간미연과 심은진은 각각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가수 활동하고 있으며 연기도 겸하고 있다. 김이지는 KBS 조이 ‘다녀오겠습니다’ MC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희진은 뮤지컬 배우로 변신했다.
◆ 슈가 … ‘코믹 연기’ 황정음 물 만났네
2002년 풋풋했던 슈가 멤버 4명은 이제 어엿한 성인 연예인으로 거듭났다. 그중에서도 황정음은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수준급 코믹 연기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재일교포인 아유미를 제외한 박수진, 한예원은 모두 연기자로 성장했다. 박수진은 MBC 사극 ‘선덕여왕’에 출연한 바 있고 한예원은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 출연해 안정적인 연기를 펼쳤다.
독특한 말투로 활동 당시 관심을 독차지 했던 아유미는 슈가 해체 뒤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3년 만에 새 앨범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 샤크라…품절녀 멤버 둘이나
샤크라 멤버 4명은 각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려원은 MBC 인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연기 신고식을 치른 뒤 영화 ‘김씨 표류기’, SBS 사극 ‘자명고’ 등에서 연기자로서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황보는 가수와 예능인으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R2SONG(아리송)’으로 영국 음원차트 1위에 올라 국내 가요계를 놀라게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샤크라 멤버 중 둘이나 유부녀가 된 것. 미스 코리아 출신 멤버였던 이니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지난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프로골퍼 권용씨와 올초 결혼식을 한 이은은 얼마 전 반가운 득남 소식을 알려왔다.
◆ 쥬얼리… 조민아 뮤지컬 배우로 2막
2006년 쥬얼리를 탈퇴한 멤버 조민아와 이지현은 각각 뮤지컬 배우와 쇼핑몰 CEO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뮤지컬 배우 4년 차인 조민아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를 시작으로 ‘달고나’, ‘온에어1’, ‘김종욱 찾기’, ‘렌트’에 출연하며 호평을 받았다.
◆ 디바 … 비키 이젠 한 남자의 여자로
1997년 데뷔한 힙합그룹 디바의 멤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다. 채리나는 룰라로 재결합해 ‘어른 돌’의 저력을 뽐내고 있으며 개성 넘치는 멤버였던 지니는 뉴욕에 있는 유명 패션 스쿨에서 공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키는 지난 7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채리나 탈퇴 이후 들어온 이민경은 유명 쇼핑몰을 운영하며 뮤지컬 배우로도 맹활약하는 중이다.
◆ 비비… 12월 웨딩마치 울리는 채소연
1996년 데뷔해 ‘하늘 땅 별 땅’이라는 곡으로 사랑을 받은 여성 듀엣 비비(BB)의 멤버 중 채소연은 오는 12월 웨딩마치를 울린다. 컨설팅 사업 중인 채소연은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랜만에 전해왔다.
또 다른 멤버인 윤이지의 근황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얼마 전 2AM의 멤버 창민이 윤이지의 조카라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밖에도 당시 소년 팬들을 이끈 파파야, 티티마, 밀크, 클레오 등 걸그룹의 일부 멤버들은 대중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문화마당]아바타가 던진 두가지 화두/김기봉 경기대 사학 교수](http://img.seoul.co.kr/img/upload/2009/07/08/SSI_20090708192728_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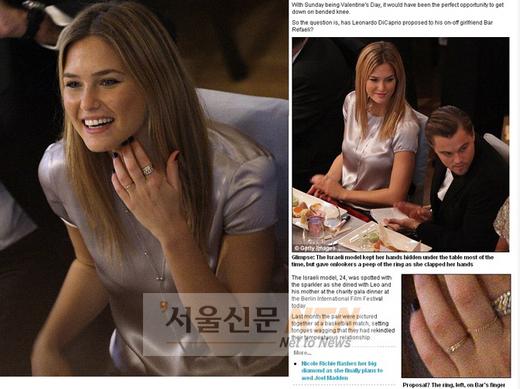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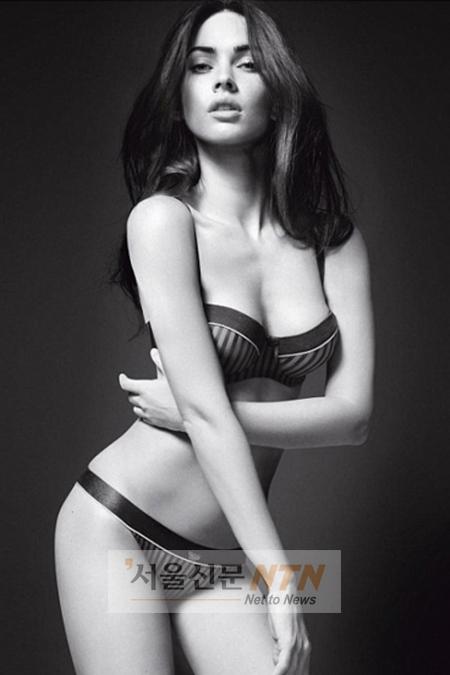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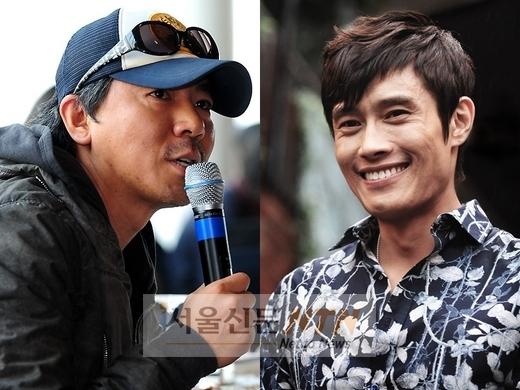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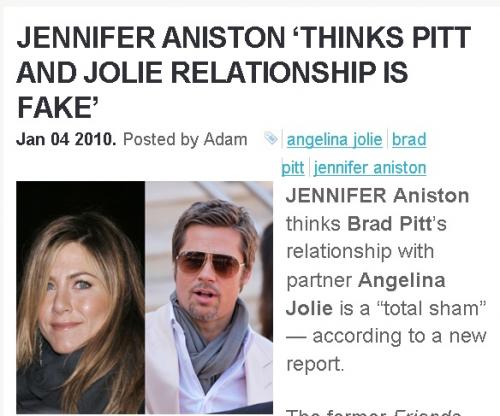

![[2009 해외연예 10대 뉴스] ‘팝 황제 죽음’서 ‘우즈 스캔들’까지](http://imgnn.seoul.co.kr/img/upload/2009/12/08/SSI_20091208095414_V.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