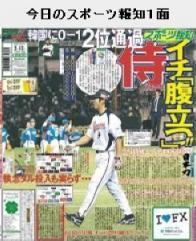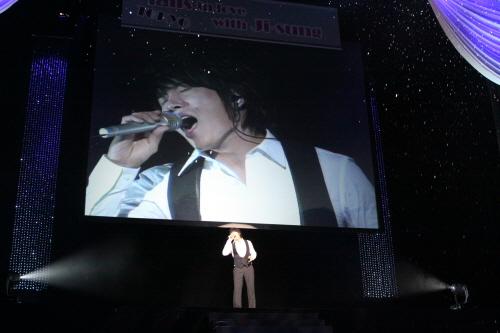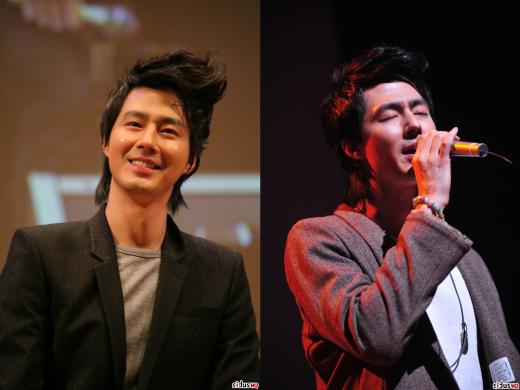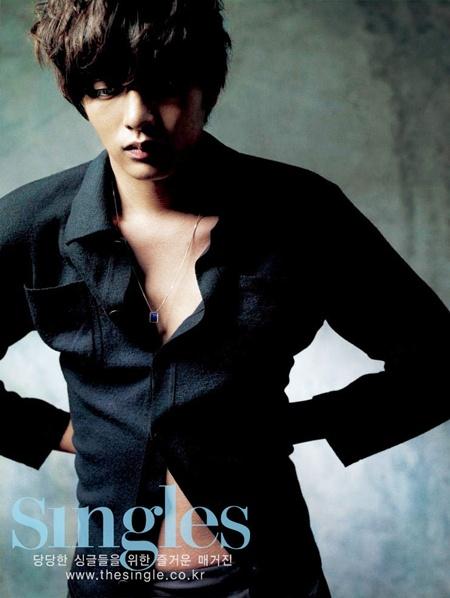가난·차별… 재일동포 1세의 삶
“재일(在日)의 역사를 남기고 싶었다. 1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 했다.”
재일 한국인의 후예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일념으로 카메라와 펜을 들었다. 2001년부터 5년 동안 일본 구석구석 발품을 팔았다. 100명이 넘는 재일동포 1세들을 인터뷰했지만, 몇몇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을 했어도 수록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듣게 된 91명의 이야기가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이붕언 지음, 윤상인 옮김, 동아시아 펴냄)이 됐다.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었던 인터뷰이들 25%가량은 일본에서 책이 발간될 2005년 당시 이미 세상을 등졌다.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이 귀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처럼 스러져 가는 역사의 뒤안길을 끌어안고 복원해 놓았기 때문이다. 사진작가인 저자 이붕언(50)씨는 오사카 출신의 재일 3세. ‘야마루라 도모히코’라는 일본 이름으로 살아 오던 그는 24세 때 한국 이름 ‘이붕언’으로 살 것을 선언했다.
책에는 60~70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외되어온 존재의 육성이 가득하다. 재일 1세들은 일제강점기 때 징용, 징병, 강제 연행으로 도일했거나 해방 후 먹고 살기 위해 현해탄을 건넜다. 6·25 전쟁이나 제주도 학살을 피해 간 사람들도 있다. 일본 패전으로 대부분이 송환선을 탈 때도 몇몇은 귀국 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일본에 남았다. 해녀, 어민, 고물상, 택시운전사, 파친코 주인, 피폭자, 민단·조총련 활동가 등 각자의 삶에서 이어온 역사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공통적으로 읽히는 무늬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겪은 온갖 차별과 편견, 가난과 핍박이다.
“일본 군대는 무차별 학살을 하고도 군인 연금을 받고, 살해당한 조선인 인부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어. 그저 개죽음이지.”(강차대 할아버지), “죽으면 한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1세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지. 1세니까.”(박한규 할아버지) 그들의 눈물 젖은 생애에 이제는 무심했던 역사가 답할 차례다. 1만 8000원.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