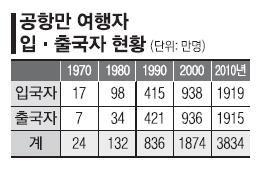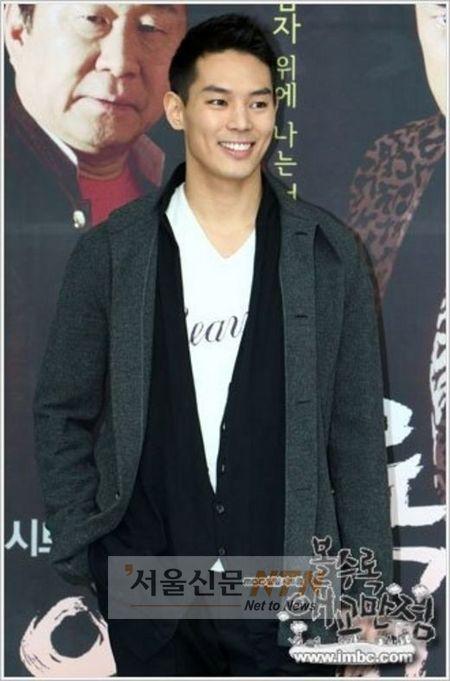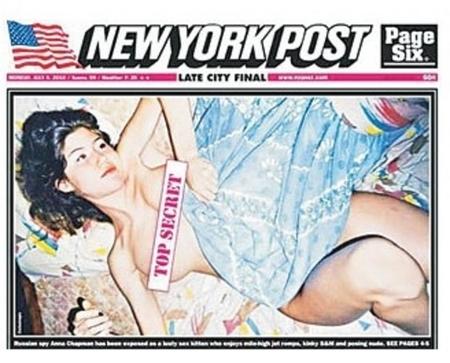[테마로 본 공직사회] (19) ‘클린카드’ 비웃는 공무원들
해마다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볼 수 있는 씁쓸한 풍경이 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뽑아 다시 까는 모습이다. 누가 봐도 예산 낭비인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해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써야 다음해에 더 많은 예산을 따낼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 혈세가 정부로 들어가는 순간 ‘눈먼 돈’이 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정부 내 ‘눈먼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가 전반의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사용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Clean Card)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부정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술집 등 업무 무관 업종 사용 제한
클린카드란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단란주점, 유흥업소, 골프장 등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로, 2005년 옛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권고하면서 그 이듬해 도입됐다. 클린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없는 업종을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클린카드 예산집행 지침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방교육청과 1만여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한다.
각 공공기관은 기재부와 행안부, 교과부 등의 지침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관별로 사용 제한처가 일부 다르기도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을 의무 제한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클린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남겨야 한다.
●‘눈먼 돈’ 쓰고보자… 모럴 해저드 심각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공직자를 징계 조치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액수는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는 기관별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관별 내부기준과 인사위원의 재량으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연도별 클린카드 부정 사용 및 관련 징계자 현황 등도 기관별로 내부 사정에 따라 관리할 뿐 통합관리되지 않아 얼마든지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클린카드 제도를 비웃은 비위 공무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와 행안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클린카드는 사용이 제한된 곳에서는 결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다. 지난달 초 공직사회를 강타했던 ‘지식경제부 룸살롱 접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경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국 직원 8명과 원전산업정책국 직원 4명 등 1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의 룸살롱 접대를 받았고, 일회 200만~300만원의 접대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했다. 클린카드는 룸살롱에서 결제되지 않기 때문에 룸살롱 업주의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꾸며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클린카드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개인 또는 결제권을 가진 부서장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정사용 가능
이를 반영하듯 권익위가 지난 한 해 동안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린카드 사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A기관은 직원들이 2009년 1~8월까지 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모두 1억 2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은 퇴임 직원 환송회 등을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클린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은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클린카드로 1억 1960여만원을 사용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서류는 없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한 정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일부 부처의 일부 직원들이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규정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6월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고 클린카드 내부 통제 장치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전 기관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권익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에서는 클린카드 위법·부당 사용이 대폭 감소했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을 확인함으로써 과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비정상적인 사용 행태들이 상당부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클린카드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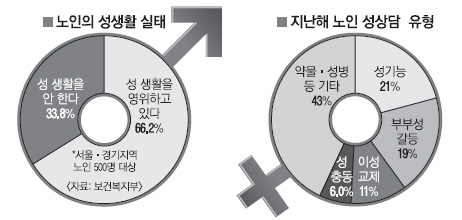
![[테마로 본 공직사회] (19) ‘클린카드’ 비웃는 공무원들](http://img.seoul.co.kr/img/upload/2011/09/19/SSI_20110919023533_V.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