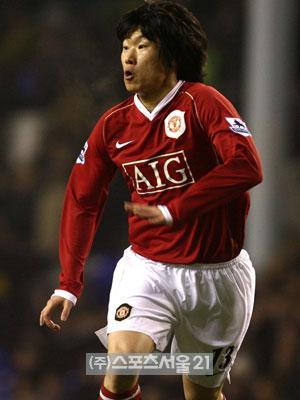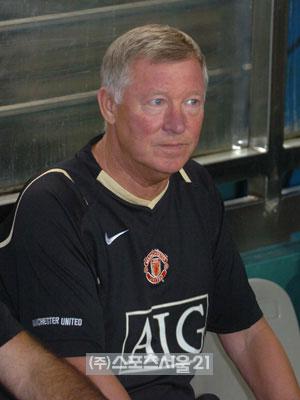[열린세상]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김혜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교수
최근 고려대가 수시모집에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라고 할 수 있는 보정점수 계산방식을 도입하였다가, 또다시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3불 정책으로 일컫는 고교등급제, 본고사제, 기여입학제는 참여정부 이래 수년간 교육 이데올로기의 대립 양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주요 사립대에서 비밀리에 고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선발하다가 적발되었고, 사립대 총장단에서도 몇 차례 3불정책의 재고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으며, 서울대에서는 본고사 시행을 강행하려다, 비판여론에 밀려 결국 취소하기도 하였다. 올해에도 3불제 비판과 옹호 논쟁은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3불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쉽사리 폐지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비판론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일 것이다.3불정책 폐지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대학은 사실 우리나라 400개의 대학 중 불과 5%도 되지 않는다. 기여 입학제는 논외로 하고, 특목고,8학군 출신 선발에 안달하고, 일반고 내신 1등급은 못미더워하는 우리나라 대학은 사실상 열손가락으로 다 꼽지 못한다. 이들 극소수 대학은 모두가 열망하는 이른바 일류대학들로 외부의 압력만 없으면 원하는 학생을 얼마든지 골라서 선발할 위치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류대학은 대다수 평민여론에 밀려 당연한 특권인 학생선발의 자유를 억압받는 억울한 귀족의 모습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대학은 대한민국을 이끌 1%의 엘리트를 존중해주지 않는 하향평등주의자들의 이기심에 개탄을 하기도 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를 고려치 않은 내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 200위권 대학에 진입하려면 진정으로 탁월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데 수능시험은 옥석을 가리는 데 역부족이라고 본다. 어찌 보면 이들 대학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특권층 대학의 배부른 편의주의와 20세기 교육관이 자리하고 있다. 즉 실력과 배경이 이미 다 갖춰진 학생을 뽑아 손쉽게 가르치고, 출세한 동문을 더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이다. 일류대의 본질은 탁월한 교육의 질이어야 함에도 최고의 교육서비스로 학생들에게 가려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노력보다는, 우리의 수준 높은 지식을 전수받으려면 제대로 배워서 오라는 낡고 오만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 이밖에도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의 주장은 다른 문제를 지닌다.
우선 일반고, 혹은 지방고교의 내신 1등급은 특정 학교, 특정지역의 1등급보다 못하다는 생각이다. 당장 수능점수, 토플점수 등의 차이를 보면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측정방식이 말해주는 것은 단편 지식의 양에 불과하며, 대학 수학능력이나, 사회 성공역량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어떠한 것도 그 하나로써 확실한 잣대가 될 수 없으나, 내신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미국에서도 최근 SAT와 대학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입학사정에서 SAT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내대학의 동일한 통계조사결과도 수능보다는 내신이 더 정확한 대학수학능력의 지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류대학이 원하는 본고사도 대학의 이기심을 포함한 또 하나의 신뢰할 수 없는 평가일 뿐이다. 최근 출제된 문제풀이식 논술을 보면 대학이 요구하는 지식과 사고의 깊이는 가히 그 대학의 교수의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1%의 엘리트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평가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다.
무엇보다도 고교등급제 본고사 주장은 교육철학에 근거하지 않았다. 일류대는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비교육적인 선발방식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3년간 평균 일등을 해온 학생도 훌륭히 키워낼 각오와 자신감이 없어서는 아닌가.
김혜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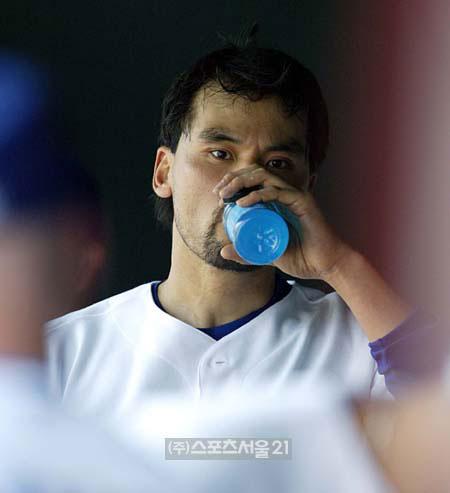
![[열린세상]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김혜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교수](http://img.seoul.co.kr/img/upload/2008/08/28/SSI_20080828185339_V.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