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청년 해외진출은 정부3.0의 시금석/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부 차관
30여년 전 필자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대학 졸업장은 취직 보증수표였다. 일부 인기학과 학생들은 기업으로부터 입도선매용(?) 장학금을 받는 호사도 누렸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1~2년씩 미루고도 취업이 어려우니 미안하고 안쓰럽다. 미취업이 장기화되면 인적자본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국가경쟁력도 추락한다. 취직이 안 되니 결혼이 미뤄지고 저출산 문제도 생긴다. 활기찬 청년정신은 사라지고 사회는 불만 속에 갈등과 급격한 노화가 진행된다.
청년실업은 어느 특정 국가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청년실업으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해법은커녕 문제만 악화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매년 2조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으나 청년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작년에는 198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단순히 나누거나 공무원 채용 3% 늘리기와 같은 개수 채우기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규제개선, 투자·창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용잠재력을 높이고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를 축소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의 해외 진출은 포화상태의 국내 고용, 창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와서 청년해외취업사업(K-move)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만 머물렀던 일자리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는 동시에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청년들에게 더 큰 세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대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2012년 한 해에 해외에서 취업한 청년이 4000명을 넘어섰고 취업분야도 IT, 건설, 서비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해외 진출에 뛰어들기에는 막막한 것도 현실이다. 청년 해외 진출은 개인의 사전준비, 열정, 역량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어려운 창업이나 취업을 해외에서 하기란 더욱 어렵다. 반면 지원기관과 정책들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 선뜻 해외 진출을 실행에 옮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기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핵심인 부처 간 벽을 허무는 융합행정이 청년 해외진출 사업에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유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해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자.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청년창업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청년봉사단,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경험 은퇴인력 활용프로그램, 교육부의 외국인 장학생 초청사업, 재외동포재단의 한상 네트워크 등이 연계돼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을 연결한 창업팀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후 전문가 심사와 컨설팅을 거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한다.
둘째,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현지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ICA, 재외동포재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물론 해외공관, 무역협회, 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지원프로그램과 현지 채용·창업정보를 연결하는 포털을 구축한다.
셋째, 국내창업과 해외창업의 프로그램 간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창업 경험은 해외에서의 창업에 실패할 가능성을 줄어준다. 글로벌 창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써 국내창업을 활용할 수도 있다. 국내창업단계에서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창업이 이뤄지도록 정보 제공, 공동 지원 등 국내 창업지원기관과 해외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넷째, 해외 진출사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스펙쌓기용 사업을 축소하고 그 재원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한다.
글로벌 시대에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세계를 상대로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날이 오길 염원해 본다.



![[기고] 해외 발전사업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이정릉 한국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http://img.seoul.co.kr/img/upload/2014/07/28/SSI_20140728171548_V.jpg)

![[다시 뛰는 한국경제] CJ그룹, 바이오·첨단사료 세계시장 공략](http://img.seoul.co.kr/img/upload/2014/07/17/SSI_20140717135953_V.jpg)
![[다시 뛰는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LNG 운반선으로 조선 불황 타개](http://img.seoul.co.kr/img/upload/2014/07/17/SSI_20140717140020_V.jpg)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삼성의 미래는 전기자동차에 있다](http://img.seoul.co.kr/img/upload/2013/11/05/SSI_20131105163028_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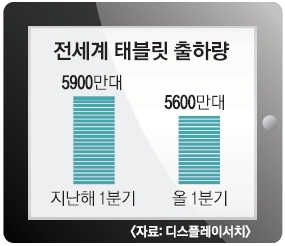

![[커버스토리] 민족주의 감정 건드리지 말자](http://img.seoul.co.kr/img/upload/2014/06/28/SSI_20140628025506_V.jpg)




![[로스쿨 탐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http://img.seoul.co.kr/img/upload/2014/05/14/SSI_20140514171134_V.jpg)


![[열린세상] 청년 해외진출은 정부3.0의 시금석/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부 차관](http://img.seoul.co.kr/img/upload/2014/02/05/SSI_20140205175450_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