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당] 기계소음에 묻힌 영혼의 별빛/문흥술 서울여대 교수 문학평론가
며칠 전, 미항으로 널리 알려진 지방의 한 도시에서 개최된 문학제에 참석하였다. 온갖 짜증나는 일상사로부터 벗어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시심 가득한 향기와 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세속의 탁류에 전혀 물들지 않은 듯한, 맑고 순수한 눈빛으로 시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를 낭송하던 이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속물화되고 획일화된 일상에 길들어져 각질처럼 굳어진 무딘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고속열차를 타고 일상의 영역으로 되돌아오는 와중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시간 이상이 걸리던 여로를 2시간으로 줄인 과학기술의 경이로움에 찬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불현듯 ‘과학기술과 문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두 권의 책을 떠올렸다.
먼저,21세기가 열리던 해에 읽었던 한 과학자의 에세이이다. 그 책에 따르면 유전공학이 발달한 21세기에는 결혼도 자식의 출산도 필요치 않으며, 다만 유전자 조작에 의해 ‘나’와 똑같은, 혹은 ‘나’와 비슷한 ‘나’의 후손을 낳을 수 있고, 나아가 ‘나’의 영생불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문학의 의의를 규정한 책이다. 원래 인간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내 영혼의 별이 되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해 주고, 어디를 가더라도 낯설지 않고 마치 집안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 세계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영혼과 육체, 물질과 정신이 합일되어 양자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연은 물론이고 ‘나’ 아닌 다른 인간마저 지배하고, 물질적 가치와 육체적 쾌락만을 중히 여기게 되면서, 아름다운 영혼의 별빛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상실된 별빛을 회복하려는 고독한 장르가 문학이라는 것이 그 책이 내린 결론이다.
두 책을 떠올리면서, 우리네 일상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다.
인터넷, 휴대전화, 텔레비전, 자동차, 전철 등과 같은 온갖 기계장치들이 토해내는 어찔한 빛과 소음이 난무하는 곳이 우리네 일상이 아닌가.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혼의 빛이 사라진 채 기계화된 육체만을 지닌 우리들이 컴퓨터와 같은 정보 메커니즘에 둘러싸여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언일까.
그저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일만 기계처럼 반복하다가 낡고 빛바래면 다른 새로운 기계로 대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영혼의 빛을 상실한 기계화된 인간이 우리네 실상이라면, 그런 사이보그 같은 인간이 영생불멸을 이룬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기계들의 삭막한 축제’에 불과하다.
지금 과학기술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네 삶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정신적 가치와 영혼의 순수함이 동반되지 않는 삶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으로 영혼의 교감을 공유할 수 없는 고속열차보다는, 차라리 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과 훈훈한 입김이 가득 넘치는 완행열차가 훨씬 인간적이지 않은가?
과학기술 만능시대일수록, 우리들 내면에 잠재하는 순수한 불꽃을 회복하려는 문학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흥술 서울여대 교수 문학평론가



![[업계소식-분양]서울 오류동 ‘서해 그랑블’](http://img.seoul.co.kr/img/upload/2007/05/31/SSI_20070531195258_V.jpg)
![[이용원 칼럼] 만주인가 동북3성인가](http://img.seoul.co.kr/img/upload/2005/07/04/SSI_20050704183614_V.jpg)

![[주말탐방] 대전역 어제와 오늘](http://img.seoul.co.kr/img/upload/2006/11/24/SSI_20061124172936_V.jpg)
![[함혜리기자의 프렌치 리포트] (2) ‘짝사랑’은 이제 그만](http://img.seoul.co.kr/img/upload/2006/10/26/SSI_20061026175625_V.jpg)
![[세계는 지금 철도전쟁중] (2) 이용자 편의 최우선 유럽철도역](http://img.seoul.co.kr/img/upload/2006/08/08/SSI_20060808180410_V.jpg)
![[세계는 지금 철도전쟁중] (1) 유럽 교통판도 뒤바뀐다](http://img.seoul.co.kr/img/upload/2006/08/07/SSI_20060807173953_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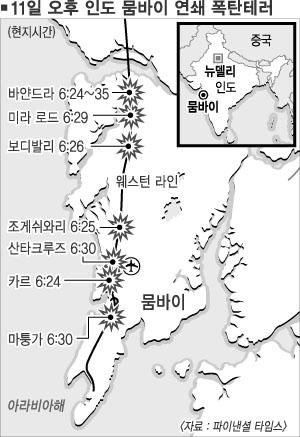
![[커리어 우먼] 최연혜 철도공사 부사장](http://img.seoul.co.kr/img/upload/2006/06/23/SSI_20060623181508_V.jpg)




